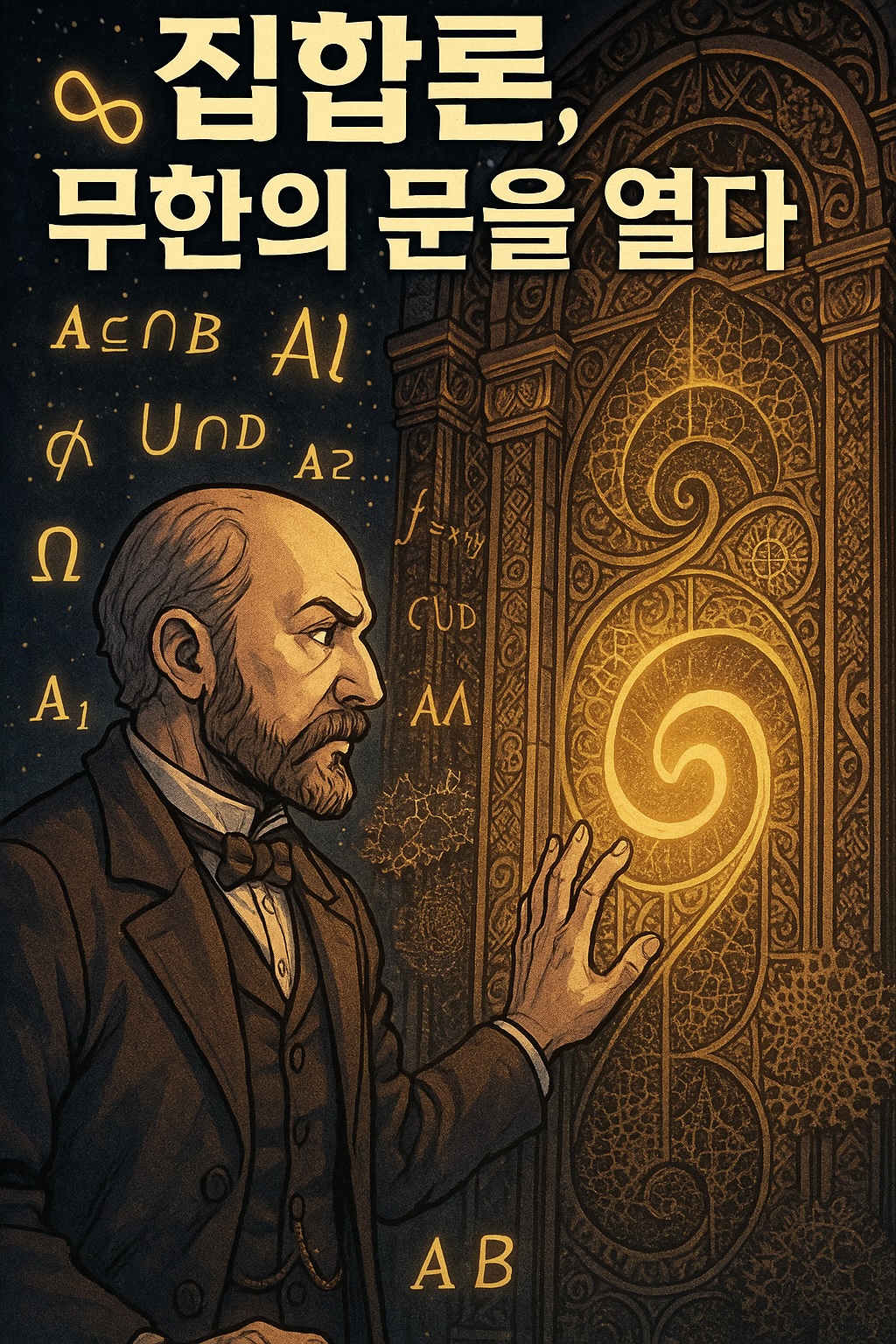키보드 위를 유영하는 다이시 카토의 손가락은 이미 경지에 올라 있었다.
세상은 그가 빚어낸 두 개의 걸작, Zustand와 Jotai에 열광했다. React 상태 관리라는 혼돈의 시대에, 그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선구자였다.
Zustand, 미니멀리즘의 정수. 간결함과 직관성으로 무장하여 복잡한 스토어 설정에 지친 개발자들에게 해방구를 선사했다. 마치 잘 닦인 단검처럼, 필요한 기능만을 날카롭게 담아냈다.
Jotai, 원자적 상태 관리의 새로운 지평. 상향식 접근법과 유연한 조합 가능성은 거대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게 해주었다. 그 정교함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두 라이브러리는 각자의 왕국을 세우고, 프론트엔드 개발 생태계의 양대 산맥으로 우뚝 섰다. 카토는 이 두 왕국의 군주이자, 쏟아지는 찬사와 기여 요청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상태 관리의 마에스트로', '혁신의 아이콘' 같은 수식어가 자연스레 따라붙었다.
"카토상, 이번 Zustand 업데이트 정말 최고예요! 보일러플레이트가 확 줄었어요."
"Jotai 덕분에 복잡한 상태 로직을 명쾌하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컨퍼런스에서 쏟아지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분명 달콤했다. 자신이 만든 도구가 누군가의 개발 경험을 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사실은 창조자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깊은 밤, 모니터 불빛만이 방 안을 채울 때면, 카토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위화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 속에서 홀로 불협화음을 내는 악기처럼, 그의 내면 어딘가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음…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작성해야 하는 건가?"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코드 블록이었다. Zustand에서는 set 함수를 호출하며 새로운 상태 객체를 반환해야 했고, Jotai에서는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하거나 Immer 같은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 Zustand 예시
set((state) => ({ ...state, count: state.count + 1 }));
// Jotai 예시 (Immer 사용)
setCount((draft) => (draft = draft + 1));
분명 틀린 방식은 아니었다. 오히려, React의 핵심 원칙인 '불변성(Immutability)'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들이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상태 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수많은 버그와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로부터 개발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했다.
그런데 왜일까. 이 정해진 규칙, 마치 상태 변경을 위한 '주문'처럼 느껴지는 이 코드들이 그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아주 사소한 값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도 거쳐야 하는 이 절차들이, 마치 매끄러운 흐름을 미세하게 끊는 작은 돌멩이처럼 느껴졌다.
"더… 직관적일 수는 없을까?"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보 개발자의 질문이 떠올랐다. 왜 상태 객체를 직접 수정하면 안 되냐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 순수한 질문. 그때는 불변성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넘어갔지만, 그 질문의 근원에 깔린 욕망이 새삼 다르게 다가왔다.
'그냥… 바꾸고 싶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만지듯, 복잡한 규칙 없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상태를 조작하고 싶은 원초적인 욕망. 그것이 단순히 초보의 미숙함이 아니라, 어쩌면 개발자 경험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Zustand와 Jotai. 두 개의 성공적인 왕국은 분명 그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에 안주하기에는, 그의 내면에 타오르는 '더 나은 방식'에 대한 갈증이 너무나도 컸다. 상태 관리의 구조를 혁신했지만, 이제는 상태를 '다루는 방식'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은 깊어갔고, 모니터에는 수많은 코드 라인들이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그의 성공을 칭송했지만, 정작 다이시 카토 자신은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아직은 희미한 불씨.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과 갈증이, 머지않아 세 번째 혁명의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