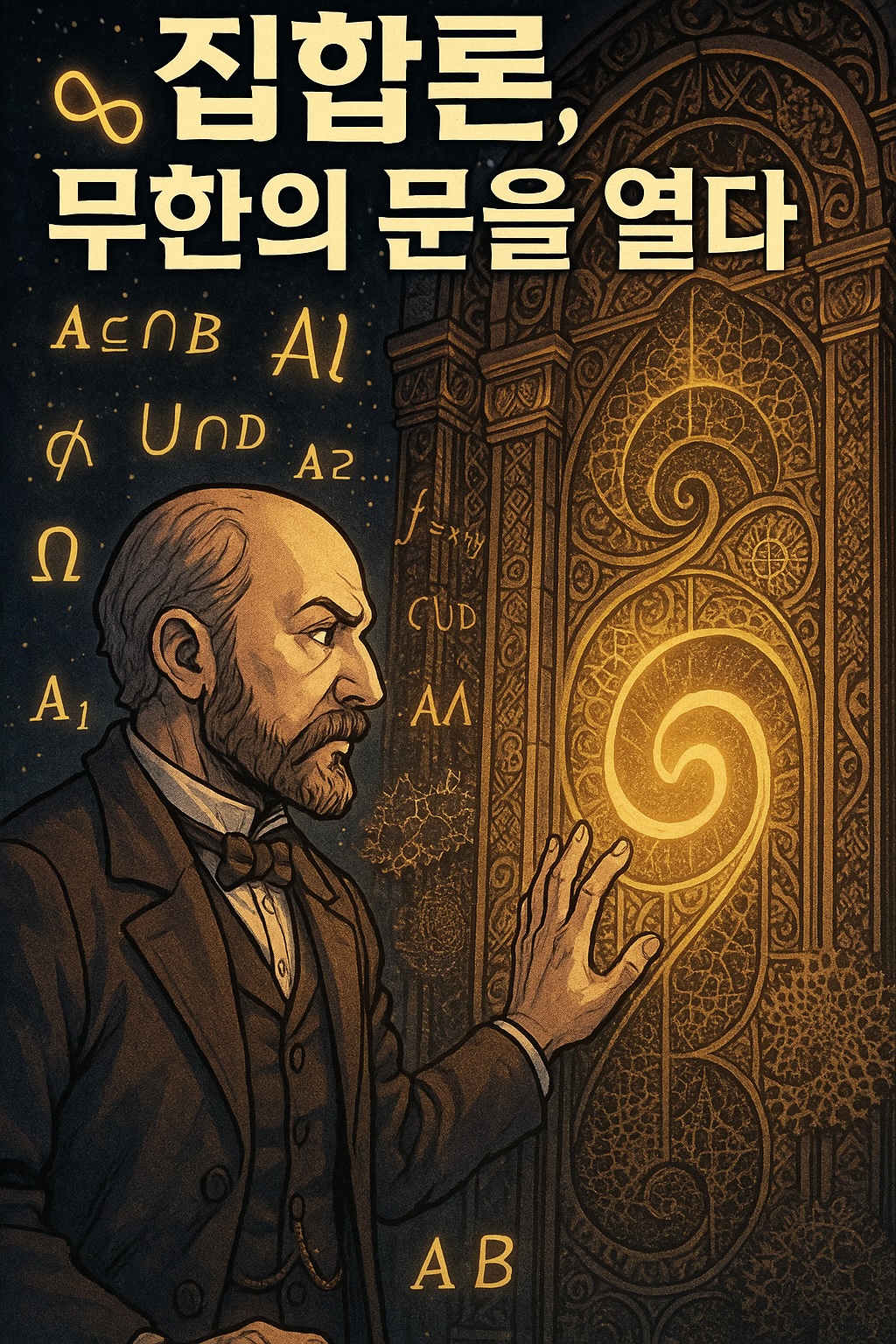1951년, 맨체스터 대학의 컴퓨터 ‘페란티 마크 1(Ferranti Mark 1)’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튜링이 NPL에서 꿈꿨던 ACE의 비전이, 맨체스터의 공학자들을 통해 현실화된 기계였다. 튜링은 마침내 자신의 이론을 시험해 볼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다.
그는 더 이상 논문 속에서의 논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기계가 인간의 지적 활동 영역을 넘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체스’였다.
체스는 단순한 보드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논리, 전략, 패턴 인식, 그리고 수읽기가 총동원되는 인간 지성의 상징적인 활동이었다. 당대 최고의 체스 마스터들은 천재로 추앙받았다.
튜링은 페란티 마크 1을 위한 체스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터보챔프(Turochamp)’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당시 컴퓨터의 성능은 터무니없이 낮았다. 메모리 용량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계산 속도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렸다.
컴퓨터는 체스판의 모든 가능한 수를 계산할 수 없었다. 튜링은 인간 체스 마스터처럼, 컴퓨터가 ‘좋은 수’와 ‘나쁜 수’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함수(evaluation function)’를 만들어야 했다.
그는 체스판의 각 기물에 점수를 부여했다. (폰=1, 나이트=3, 퀸=9 등)
그리고 기물의 위치에 따른 가중치를 두었다. (예: 중앙을 차지한 나이트는 구석에 있는 나이트보다 가치가 높다.)
컴퓨터는 이 평가 함수를 이용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수를 선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
하지만 페란티 마크 1의 성능 한계 때문에, 튜링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완전히 실행시킬 수 없었다. 그는 좌절하는 대신, 놀라운 일을 벌였다.
그는 스스로 ‘인간 컴퓨터’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체스 알고리즘이 적힌 노트와 연필, 종이만 가지고 동료인 알릭 글레니와 체스를 두었다. 그는 한 수를 둘 때마다 30분 이상씩, 자신의 알고리즘에 따라 모든 계산을 손으로 직접 수행했다. 기계처럼, 오직 규칙에 따라서만 수를 결정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29수 만에, 튜링의 알고리즘은 글레니의 퀸을 잡아내며 승리했다.
그것은 인간 튜링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알고리즘, ‘터보챔프’의 승리였다. 그는 기계가, 비록 느리지만,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지적인 게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인간 지성의 또 다른 영역, 즉 ‘창의성’에 도전하기로 했다.
튜링은 맨체스터 마크 1을 이용해 간단한 ‘러브레터 생성기’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그는 먼저 컴퓨터에 제한된 수의 명사, 형용사, 동사 어휘 목록을 입력했다.
(예: 명사 - 사랑, 열정, 심장 / 형용사 - 아름다운, 뜨거운, 간절한 등)
그리고는 간단한 문법 구조 템플릿을 제공했다.
(예: [형용사] [명사]는 나의 [형용사] [명사]를 [동사]한다.)
컴퓨터는 이 템플릿과 어휘 목록을 무작위로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어냈다.
“뜨거운 열정은 나의 아름다운 사랑을 갈망한다.”
“간절한 심장은 나의 뜨거운 열정을 원한다.”
결과물은 조악하고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우연히, 그럴듯하고 시적인 문장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것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창작은 아니었다. 하지만 튜링이 보여주고자 한 것은 명확했다. 창의적인 활동처럼 보이는 행위 역시, 결국에는 정해진 규칙과 데이터의 조합으로 ‘흉내’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계의 어휘와 문법 규칙이 점점 더 정교해진다면, 언젠가는 인간의 작품과 구별하기 힘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체스 두는 기계, 사랑 시를 쓰는 기계.
튜링은 자신의 이론을 구체적인 코드로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맨체스터의 컴퓨터는 그의 손에서 더 이상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지능의 비밀을 탐구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지적 탐구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